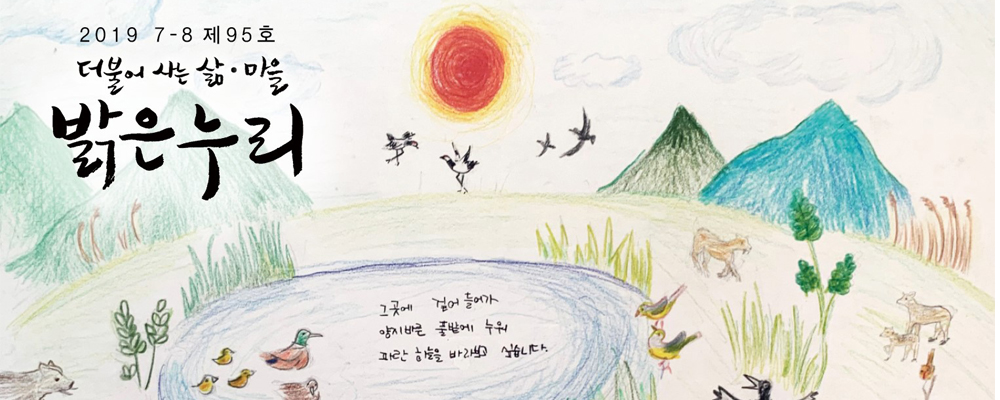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경계선에 갇히지 않는 나의 뿌리를 찾다
태초의 평화를 누리는 소처럼
올해 2월부터 길벗들과 함께 생명평화 고운울림 기도순례를 다니고 있다. 이번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멀게 느껴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찾았다. 분단체제에서 이념에 대한 갈등을 겪었기에 결코 친근하게 느낄 수 없던 두 나라다. 왜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은 친숙하게 여기면서 우리 땅과 연결된 중국과 러시아는 그토록 거리감을 두었을까?
마음 깊은 곳 두터운 벽이 무너지는 시원함
순례지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풍경은 바로 드넓은 벌판이다. 러시아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풍경, 서른해 넘은 내 삶에 들판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산등성이가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반으로 똑 잘린 남쪽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보니 내게 ‘들판’은 단지 사전에만 있는 개념이었다. 처음 러시아의 끝없는 지평선을 봤을 때, 마음 깊은 곳의 두터운 벽이 무너지는 듯한 ‘시원함’을 경험했다. “말이 돼서 저 벌판을 달리고 싶다.” “새처럼 날고 싶다.” 저 넓은 벌판으로 나를 던지고 싶은 갈망을 발견했다. 그건 경계를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갈망이었다. 그간 역사의 질곡으로 이 땅에 선이 그어지고 국가라는 경계선을 날 때부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 나를 가둔 허상을 뚫고 갇히지 않고 살아갈 몫이 주어졌음을 느꼈다. 나의 기원, 나의 뿌리를 더 근원에서 발견한 듯했다.
태초의 생명을 떠올리다
끝없는 벌판을 바라보며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무려 50시간 넘게 달렸다. 그렇게 도착한 벌판의 한복판엔 ‘바다’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거대한 바이칼호수가 있었다. 우리는 바이칼의 알혼섬을 찾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명들을 마주했다. 갇혀있지 않은 소, 묶여있지 않은 개, 고삐 없이 갈기를 휘날리며 평야를 달리는 말, 바이칼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범 바이칼 물범이라고도 하는 민물 물개로 바이칼호에만 사는 종이다. 해양동물로 알려진 물범이 어떻게 바이칼호에 살게 되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네르파. 자유로이 다니는 무수한 생명들은 태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닌 듯했다. 알혼섬의 많은 생명 가운데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소’였다. 경이로웠다.
알혼섬의 소들은 바이칼을 따라 이어지는 금빛 모래사장에서 따사로운 해를 받으며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목이 마르면 바이칼 물을 마시고 찰랑찰랑 들어오는 물결에 발을 담궜다. 알혼섬의 소들은 키운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자유롭게 산책을 나가 풀을 뜯고 다녔다. 다들 외출 중이라 소 우리가 텅텅 비어있다. 줄지어 길을 거니는 소들은 사람이나 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초의 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자연스레, 지구 곳곳에서 흙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공장에서 도축되는 소들이 겹쳐져 떠올렸다. 창조주가 지으신 동물의 삶은 이토록 존엄한데….
나누고 규정하지 않는 '한 겨레'로
순례지 곳곳에서 “온 생명 곱게 어울리는 밝은누리 씨알로 살게 하소서” 노래로 기도했다. 노래로 기도하며 우리는 언어를 넘어 교감할 수 있는 길벗들을 만났다. 어떤 이들은 기도 내용을 듣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에 공감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멀리서 노랫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쓰는 말, 살아온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온 누리 밝게 비추는 생명평화를 한 마음으로 구했다.
순례 중에 조선땅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 한 길벗이 반갑고 궁금한 마음에 처음에 고려인인지 조선족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런 게 어디 있습네까? 다 한민족이지”라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 순간, ‘그렇지! 고려인, 조선족, 한국인, 재일조선인이라는 틀을 넘어 우리는 한겨레지!’ 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그리고 한겨레를 넘어 온 생명으로 곱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평화의 길임을 떠올렸다. 분단된 땅을 넘어, 자유롭게 어울리는 생명들과 노래로 기도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규정하지 말고, 가두지 말고. 온 생명 곱게 어울리는 밝은누리 씨알로 사는 삶.
보다 넓은 지평에서 찾아가는 우리 얼
북간도, 연해주, 시베리아를 누비며 북방 드넓은 벌판에서 살아간 생명들의 삶을 생각했다. 그 옛날 ‘코리안’으로 불렸던 선조들, 하늘을 공경하고 이 땅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역사의 질곡 속에 고통 받은 사람들..
나는 겨우 100년 남짓 살고, 2000년대 초라는 물리적 시간 속에 살지만, 이미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몸에 새기며 살고 있는게 아닐까? 알혼섬의 신비로운 바위처럼, 맑고 푸른 바이칼처럼, 시베리아 벌판처럼, 인수마을을 품어주는 북한산자락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질곡도 길게 보면 찰나가 아닐까? 이젠 그토록 아팠던 날들을 보듬고 더 넓은 지평에서 우리 얼을 찾아가고 싶다.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움처럼 근원에서 ‘생명평화’를 더듬어본다.
“온 생명 곱게 어울리는 밝은 누리 씨알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기도 노래처럼, 분단을 넘어, 경계를 넘어, 시공간을 넘어 온 생명 곱게 어우러지는 평화가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허정은 | 홍천 서석면과 서울 인수동을 오가며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삶을 일구며 지내요.
'특집기사 > 동북아 생명평화의 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나 되는 날 마음에 꼬옥 품고 _ 밝은누리신문 90호(2018.8~9) (0) | 2018.10.06 |
|---|---|
| 한결 같은 하늘, 하늘은 하나다 _ 밝은누리신문 90호(2018.8~9) (0) | 2018.10.06 |
| 동북아평화시대에 돌아보는 백두산, 시베리아, 바이칼 _ 밝은누리신문 90호(2018.8~9) (0) | 2018.10.06 |
| 뜻을 품고 창조적으로 살기 _ 밝은누리신문 90호(2018.8~9) (0) | 2018.10.06 |
| 당당한 기개와 따뜻한 의리 _ 밝은누리신문 90호(2018.8~9) (0) | 2018.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