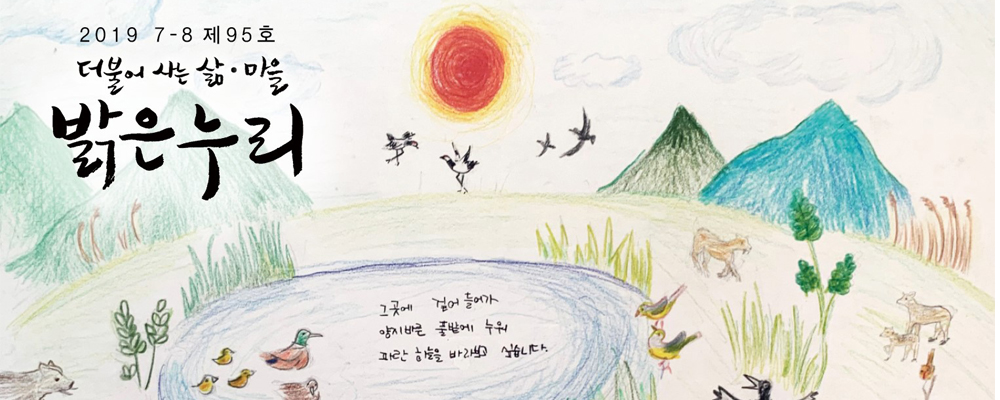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알록달록 더불어 사는 일상의 신비
시계를 보니, 여섯시 반이다. 못 다 쓴 기획안이 눈에 밟히지만, 퇴근하기로 한다. ‘지금 가면 8시쯤 도착하겠네.’
“8시 넘어서 갑니다.”
사무실을 나서서 부지런히 내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면, 마을밥상으로 간다. 유기농 식당인 이곳은 8시 반까지 밥을 뜰 수 있는데, 8시가 넘어 도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한다. 행여 밥이 똑 떨어져 늦게 온 사람이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끔 답장을 받기도 한다. “어여 와.”
씹을수록 맛있는 현미밥과 따뜻한 국, 입맛 돋우는 반찬들은 빈 속을 편안하게 채워준다. 반가운 얼굴들과 지내는 이야기 주고받으며 마음까지 채우니 든든하다. 오늘은 몇 달 전까지 한 집에 살았던 동생을 만나 요즘 지내는 이야기를 들었다. 풋살을 밥보다 좋아할 것 같은 친군데, 풋살하다 다리를 다쳐 우울하단다.
“잘 먹었습니다!”
맥없이 들어갔던 모양과 다르게 힘찬 기운으로 인사하고 나오면 시원한 밤공기가 놀자 할 때 있다. 요즘 뚝딱뚝딱 지어져간다는 두 번째 마을찻집으로 밤마실 가야겠다.
내가 매일 직장과 집을 오가며 바빴던 동안, 마을에서 지내는 이들이 제 몫 톡톡히 해준 덕에 누구나 만나고 공부하며 쉼의 시간가지기 좋은 멋진 공간이 꾸려졌다! 늦은 시간까지 찻집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장님이자 마을 언니의 어깨며 팔을 주무른다. 그것으로 뒤늦게 품 보태려했지만, 곳곳에 어린 수고의 손길 떠올리니 어림없겠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언니의 퇴근길을 함께했다.
집에 곧장 가지 못하고, 마을찻집 ‘마주이야기’에 있는 친구를 만났다. 아토피로 몸과 마음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 친구 이야기 들으며, 친구가 이 때를 기회 삼아 잘 지내길 응원하게 된다. 밖에서는 마음 놓고 뭔가를 먹지도, 맘껏 숨을 들이쉬지도 못 하는 요즘을 살면서 그 친구의 고민을 함께 느끼니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씩씩하게 꽃잎 떨어진 길을 걸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아침 일찍 나섰던 집에 돌아오니 같이 사는 식구들이 저마다의 모양으로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옆에서 깍짓손을 베고 누워 저녁에 만난 이들의 눈빛과 나눈 대화 떠올려본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여러 생명들로 알록달록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새삼 신비할 따름이다. 관계 맺기 두려워 어둡고 불안한 날들 길게 보냈다. 그 시기 내 옆을 우직하게 지켜준 이들 생각난다. 그 덕분에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샘솟고, 꼭 그럴 수 있을 것만 같다.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걸까?
이보경 | 9개월 차 새내기 직장인. 함께 사는 이들에게 생기 얻고, 더불어 사는 삶 배우며 지내요.
'더불어사는삶 > 함께산다는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불어 사는 삶으로 초대 _ 밝은누리신문88호(2018.6) (0) | 2018.07.11 |
|---|---|
| 이미 가진 것으로 누리는 넉넉함 _ 밝은누리신문87호(2018.5) (0) | 2018.06.14 |
| "세상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_ 밝은누리신문85호(2018.3) (0) | 2018.04.09 |
| 익숙한 사이, 편안한 사이에서 _ 밝은누리신문84호(2018.1~2) (0) | 2018.04.04 |
| 큰일은 힘 모으고, 맛난 음식 나눠먹고 _ 밝은누리신문83호(2017.12) (0) | 2018.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