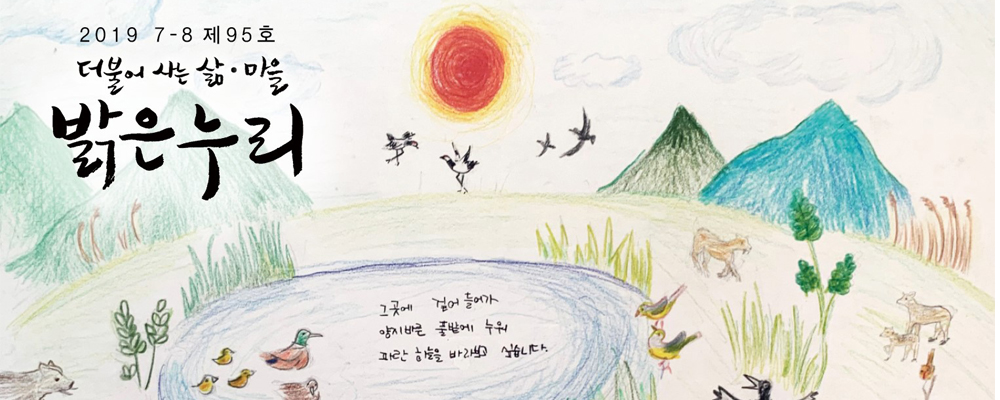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함께 밥 먹고 아이 키우는 일상에서
마을, 제대로 공부하고 살린다
청년아카데미에서 ‘마을공동체운동’ 강좌가 열렸다. “공동체에 관심 있어 왔다”, “공동체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고 함께 사는 삶이 궁금하다”, “학교 선배들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취업·결혼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배우러 왔다” 다양한 자기 이유와 질문, 기대를 품고 많은 이들이 4주간 강의에 함께했다.
언젠가부터 마을이 상품이 돼버렸다. 아파트단지 이름에도 ‘진달래마을’, ‘무지개마을’…, ‘마을’을 붙인다. 원래 마을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지만 누구나 마을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우리 옛 선조들이 살던 마을은 공동체였다. 서로 돕는 두레와 품앗이가 있고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며 마음과 정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일제와 군부독재를 거치며 도시화·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을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마을공동체로 살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강사인 최철호 공동체지도력훈련원장은, 마을이 수유동, 우이동 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마을은 이해관계 없이, 목적의식 없이 자기 몸의 지극히 일상적인 동선에서 만나는 관계망”이라고 정의한다.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아이 키우고, 운동하고, 마실 다니는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마을이다.
좋은 뜻과 신념이 있다고 실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진가는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상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데 나 홀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질서의 힘이 있다. 자본주의, 학벌사회, 가족이기주의 등이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 단위로는 이를 넘어서기 어렵다. 어깨 걸고 그 힘을 이겨낼 벗들이 필요하다. 벗들과 함께 먹고, 입고, 자고, 놀고 살아가며 식·의·주·락 생활양식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모습은 다르지만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다. 평생을 함께할 벗들을 만나 그들과 아이 데리고 마실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며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땅 곳곳에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들이 생기고, 그 마을들이 서로 연대하는 ‘밝은 누리’를 꿈꾼다.
윤은주 | 멋진 북한산이 보이는 인수마을 ‘둥지’ 공동체방에서 재미있게 살며,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마을밥상과 찻집에서 만나는 아이들, 친구들 보면 하루 피로가 가십니다. 마을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소통과대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1세기 미래문명 희망 _ 밝은누리신문81호(2017.10) (0) | 2017.12.10 |
|---|---|
| 생태적 삶을 향하여 _ 밝은누리신문79호(2017.7) (0) | 2017.08.21 |
| 샘솟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 _ 아름다운마을68호(2016.06) (0) | 2016.06.21 |
| 경세제민 구현하려 불평등문제 파고들다 _ 아름다운마을67호(2016.05) (0) | 2016.05.30 |
| 졸업 그 이후, 함께라면 문제없어 _ 아름다운마을66호(2016.04) (0) | 201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