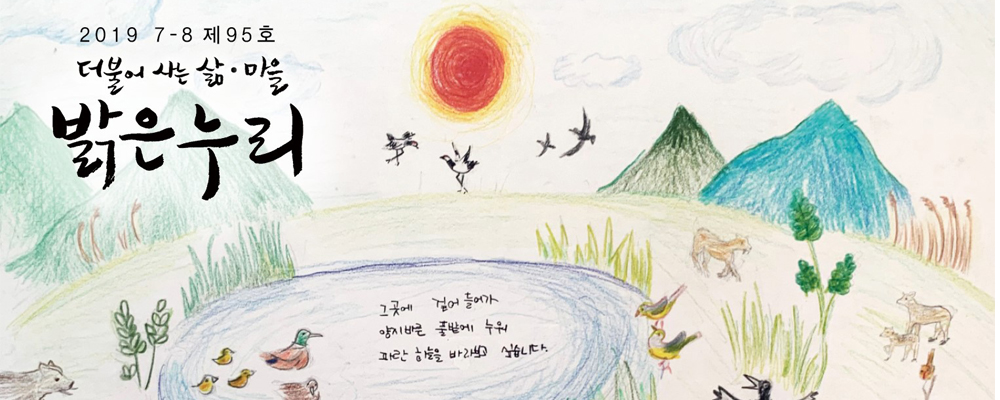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늘 새로운 이야기? 그건 허구죠"
지역말, 우리 어머니의 삶을 담아온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

표준어가 아니라 지역말,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귓가를 맴돈다. 10월 9일 한글날, '시대를 밝히는 글쓰기 현장 탐방'에서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을 만났다. 아침 8시, 서울 인수동에서 어른 일곱과 아이 하나를 태운 승합차가 광주광역시를 향해 출발했다. 여섯 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사무실. 황풍년 님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셨다. 사무실은 단정했고 아담했으며 생활공간처럼 푸근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곳에서 찐 고구마와 포도를 대접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는 황풍년 님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전라도닷컴>은 2000년에 인터넷으로 창간하였다가 2002년부터 종이로 발간하는 월간지다. 지역 언론사에서 일했던 몇몇 기자들이 마음을 모아 시작했고, '표준어'가 아닌 전라도 토박이말이 가득 담기는 잡지다. 화려함을 앞세우는 예술 사진은 없다. 사람들의 생활 현장을 담은 사진을 사람 이야기보다 앞서지 않게 앉힐 뿐이다. <전라도닷컴>에는 전라도 토박이말이 무수하게 인용된다. 말에 '맞는 말', '틀린 말'이 있을 수 없는데 언론들은 할머니의 전라도 토박이말을 따옴표 처리해 놓고 '서울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없다. 강남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뉴스에 정신을 팔고 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 삶에서 뱉어낸 자연 발아적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매체가 없다. 여태껏 글을 배운 사람은 권력자의 말을 기록했다. 역사의 주역인 민중, 백성은 기록에 거의 없다. 백성의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 갯벌 바닥을 기는 어머니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언어였다.
문화 잡지를 보면 죄다 전문가들, 세계적 연주자, 세계적 성악가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문화를 밀어낸다. 그러나 <전라도닷컴>의 주인공들은 시골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1909년 민적을 보면 광주군의 양반 비율이 0.9퍼센트다. 100명에 한 명 꼴도 안 된다. 우리 시대 가장 필요한 기록은 양반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표준어라는 것은 문화 획일성이며 상상력을 제한한다. 사투리로 폄하되는 지역말을 안 쓰는 것에 길들여졌다.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억수로 반갑데이"를 "정말 반갑습니다"로 바꾸어 놓는 것은 왜곡이다.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이 한국어 확장이 아니라 획일화를 조장한다. '표준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동네 저 동네 말이 다 다르다. 전라도에 '개미지다'는 표현이 있다. 깊은 맛, 속맛, 두고두고 그리워지는 깊은 맛을 가리킨다. 겉절이가 아니라 묵은지에서 나오는 맛이다. 사람을 두고 상찬할 때는 '귄있다'고 한다. '예쁘다'와는 다르다. "보면 볼수록 귄이 있어라" 하면 사람의 품성까지 담아 표현하는 말이다. '귀엽다'와 비슷할 것 같지만 서울 '표준어'로 대체 불가능한 말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훼손하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떤 분들이 전라도닷컴을 시작했으며 그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언론사에서 노동조합을 했고, 불법파업이라며 징계받고 그래도 회사를 나가며 싸웠는데 99년 12월 31일에 사표를 냈다. 정치에 꿈을 두기도 했지만 좋은 언론사 사장이 되고 싶었다. 언론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섯이 모여 연예인들 뒷담화나 스포츠 스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돈 많고 권력 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가 이 시대에 없었다. 그래서 전라도닷컴을 인터넷으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 품은 뜻과 달리 여러 상황을 겪었을 텐데 현재 안고 있는, 혹은 극복한 과제가 있다면.
구독료와 광고 수입으로 경영을 하는데 광고 수입이 더 크다. 전라도에는 광고 줄 만한 기업이 없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줘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축제 기사나 군수 인터뷰 등을 하면 광고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너희도 숨통 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냐며.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쓸 기사가 아니고 독자들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다(우리 독자 100명 중 50명은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독자다). 잡지 몇 달 더 하려고 그런 짓을 하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의 저항이 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단다. 사실 오래 들여다보면 사람살이는 다 고만고만하다. 대중매체에 길들여지다 보면 늘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건 허구다. 일상적으로 같이 끼고 살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차이, 다름을 서로 길들여 가면 된다. 텔레비전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매체다. 잘 차려 입은 언니들, 할배들이 먹고, 떼로 다니면서 구경하는데 이건 농어촌 사람들의 삶을 눈요깃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프로그램들이다. 사회에 매체가 많아지고 종편도 쏟아지고 볼거리가 넘쳐난다. 군보, 시보 같은 것도 공짜로 뿌린다. 그래서 어렵다. 세월호 이야기를 3년간은 하겠다 하고 기사를 쓰니 독자가 떨어져 나간다.
- 전라도닷컴이 그리는 희망, 미래는 어떤 것인가.
'다리' 특집을 낸 적이 있다. 다른 매체 같으면 세계적 다리를 다루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얽힌 다리 이야기를 다루었다. 건설사에서 사장으로 일했다는 어느 독자가 메일을 보냈다. 다리에 얽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간을 이롭게 할 다리를 만들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좋은 뉴스란 발 딛고 사는 내 삶을, 환경을 고쳐 주는 뉴스다. 발 딛고 사는 이야기가 다루어져야 한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선거 보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고, 언론은 유권자들이 옥석을 구분하도록 기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만들어진 뉴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선거를 재미,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다. 경상도 사람은 이 사람 찍고, 전라도 사람은 저 사람 찍도록 지역 구도를 조장한다. 설령 그런 기준을 각 지역마다 주려 해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 보도가 왜곡되는 것이다. 혁명은 자본으로 되지 않는다. 무수한 작은 매체들이 발 딛고 선 곳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기록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황풍년 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15년 동안 한결 같은 신념으로 살아온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조용하게 자기 신념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향기가 풍겨져 나와 4시간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피곤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컸다.
김준표 | 인수마을에서 좋은 벗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며, 우리말,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과 재미에 눈떠가고 있습니다.
'소통과대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정을 즐기고, 작은 숲을 만들자" _ 아름다운마을64호(2016.1~2) (0) | 2016.02.23 |
|---|---|
| "자기 몸과의 관계가 삶의 기본" _ 아름다운마을신문62호(2015.11) (0) | 2015.12.07 |
| 다시 살게 해주는 힘을 보다 _ 아름다운마을신문60호(2015.8~9) (0) | 2015.09.22 |
| 남북, 같이 살 수 있는 길 찾자 _ 아름다운마을신문57호(2015.05) / 한완상,통일인문학콘서트 (0) | 2015.05.27 |
| "만물은 한 피붙이, 아집을 버려야" _ 아름다운마을55호(2015.03) (0) | 201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