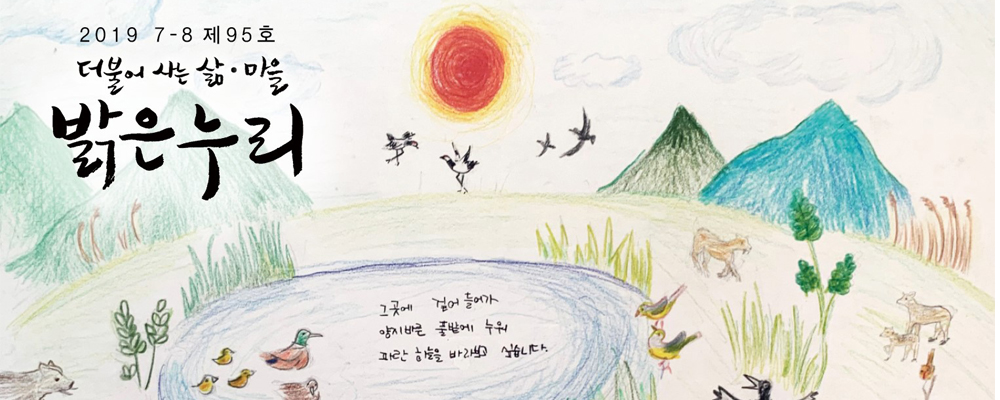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지구에 쓰레기 하나 덜 얹으려면

생협 잡지에 재활용에 관한 원고 한 꼭지를 청탁받고, '재활용'이 자기만족을 위한 상징행위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도시문명에서 세련되게 포장된 또 하나의 상품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기반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자본이 몰리는 유아복·완구시장을 보면 마치 '소비가 최선의 육아'가 된 것 같다. 그렇지만 마을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유해한 화학물질 투성인 새 제품보다, 언니오빠 흔적이 배인 옷이 아이들에게 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마을에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은 꼭 새 것이어야 한다는 관념도 바뀐다.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 중 좋은 걸 골라서 "이 선물로 말하자면…" 늘어놓는 생색으로 축하자리는 한층 정겨워진다. 마을에서 물건이 서로 통용되고 계속 순환되는 일상이 있기에, 내가 소유한 건, 잠시 나를 거쳐 가는 것, 내가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라는 마음도 깃든다.
임신을 하고서 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을 때 나는 어떻게 편히 잠을 청할까 궁리하다가 귀여운 아기 양말과 꼬까신을 자는 방 벽에 걸어놓았다. 이웃들에 잉태 소식을 알리자 아기 키우는 가정들에서 조용히 건네준, 출산육아물품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누군가 손바느질로 만들어서 썼던 속싸개며, 젖 얼룩이 물든 수유복, 수십 번은 더 삶았을 천기저귀, 여러 아기들 입을 거쳐 온 딸랑이 등이 가득 담긴 고마운 보따리를 풀어보며 임신기간을 쇼핑으로 허비하지 않고 차분히 뱃속 생명과 교감하며 지낼 수 있었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책과 정보도 물려받았는데, 그보다 앞선 부모들의 삶의 자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더불어 사는 마을을 전제로 한 자원 순환
마을에서 비슷한 시기에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여성들과 모여앉아 아기옷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지금도 종종 마을밥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물려받은 옷들을 모아놓고 누군 파스텔톤이 어울린다, 누군 빨간 옷이 잘 맞는다, 누군 배가 볼록하니까 허리춤이 넉넉해야 한다, 좀 더 자라면 이런 게 요긴할 것이라며 서로 필요한 옷을 골라주기도 하고, 이미 갖고 있는 옷이 많다고 좀 덜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옷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야기꽃이 활짝 핀다. 굳이 말하자면 아직 어린 아이보다 엄마의 선택이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 맘에 드는 옷을 가져야 묵히지 않고 실컷 입힐 수 있으니까.
마을 아이들은 철이 바뀔 때마다 옷을 물려 입는 옷 잔치를 한다. 위의, 그 위의, 더 위의 형님들 옷부터 줄줄이 내려온다. 마을어린이집과 마을초등학교에서 옷 잔치하는 날에 맞춰 집집마다 장롱에서 작아진 옷들을 정리하여 새로운 임자를 찾아 보낸다. 아이들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몇 번 입지 않은 옷들도 있고, 십년 가까이 내려오는 옷들도 있다. 형님들만큼 자라는 게 뿌듯한지 아이들도 자기 옷이 어떤 언니나 오빠가 입었던 옷인가 확인하곤 한다.
마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네 살배기 딸아이는 얼마 전 옷 잔치에서 받아온 치마를 벗을 줄 모르고 몇 바퀴를 돈다. 옷을 스스로 고르고 싶어지기 시작한 나이, 그동안 입어보지 않던 모양새를 손수 골라 온 게 그리도 맘에 드나보다. 머리보다 두 팔을 먼저 넣어서 입을 수도 있다며 자신있게 보여준다. 게다가 신던 신발도 작아진 참이었는데, 평소 애들 차림을 잘 아는 선생님들이 마침맞게 챙겨주셨다. 든든한 마음이 깃든다.
아이에게 어떤 비싼 걸 사줘도 아깝지 않을 부모 마음을 자극하면서 육아용품 시장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소위 '신상'을 내놓는다. 다른 누군가 새 걸 갖고 있으면 금세 그게 부러워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작동하기도 한다. 아무 것도 아닌 물건 하나로 관계에 틈을 낼 수 있을 만큼 소비문명의 위력은 큰 것이다. 재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염치이다. 마음을 투명하게 나누면서 제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도록 돌아보게 된다.
버려지는 것도 다시 살리는 농생활

공동체 나눔터는 마을에 있는 물건이 필요한 이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다. 마을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쇼핑몰을 클릭하지 않고 우선 공동체 온라인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런 것도 있을까 싶지만 수소문해보면 마을 어딘가에서 꼭 나온다. 집 한 켠에서 잠자던 물건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니 기꺼이 나누겠다는 댓글이 달린다. 빌린 것이지만 충분히 쓸 수 있고, 받은 것이어도 언제든 내가 안 쓰게 되면 또 다른 이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공동체 나눔터가 있기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정리할 때마다 자신이 과하게 사유화하고 집착하는 건 뭔지, 손쉽게 버리기 전에 다시 쓸 수 없을까 살펴보게 된다.
길거리에 멀쩡한 가구들이 버려지고 또 수거되기까지 비에 젖고 방치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가구도 유행을 타서 예전에 신혼집 필수품이던 텔레비전 장식장이 이제 벽걸이텔레비전 때문인지 줄줄이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걸 다시 쓰려면 수리, 유통을 거쳐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재활용산업으로 인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활용산업으로 인해 오히려 쓰레기와 소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
지구에 쓰레기 하나 덜어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재활용'이 시작된 유래가 아니었을까? 흙과 돌,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생태건축연구소 흙손 구자욱 님도, '지구에 해가 덜 되는 공법과 재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홍천마을에서는 쓰레기마저 일상적으로 재활용했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 몸에 맞게 복원하려고 애쓴다. 생태뒷간에서는 똥오줌을 모으고, 밥상부산물을 모아서 밭거름으로 쓴다. 인수동에서도 마을밥상과 집집마다 밥상부산물을 한 데 모아서 매주 홍천마을로 보낸다. 농도상생마을은 도시에서의 자원 순환을 넘어 밥이 똥이 되고 똥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밥상에 오르는 생명 순환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게 해준다.
최소란 | 날마다 아이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아침마다 북한산 인수봉 표정을 바라보며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기타 > 空과共(공과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은 무겁고 삶은 묵직하고 _ 아름다운마을40호(2013.08) (0) | 2014.12.30 |
|---|---|
| 이웃이 필요할 때 내 차 쓸 수 있도록 _ 아름다운마을37호(2013.05) (0) | 2014.11.15 |
| 전자레인지 없이 군침 나게 _ 아름다운마을36호(2013.04) (0) | 2014.11.14 |
| 텔레비전보다 재밌는 _ 아름다운마을35호(2013.03) (0) | 2014.11.14 |
| 스마트폰 없어도 스마트할 수 있는 삶 _ 아름다운마을34호(2013.1~2) (0) | 201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