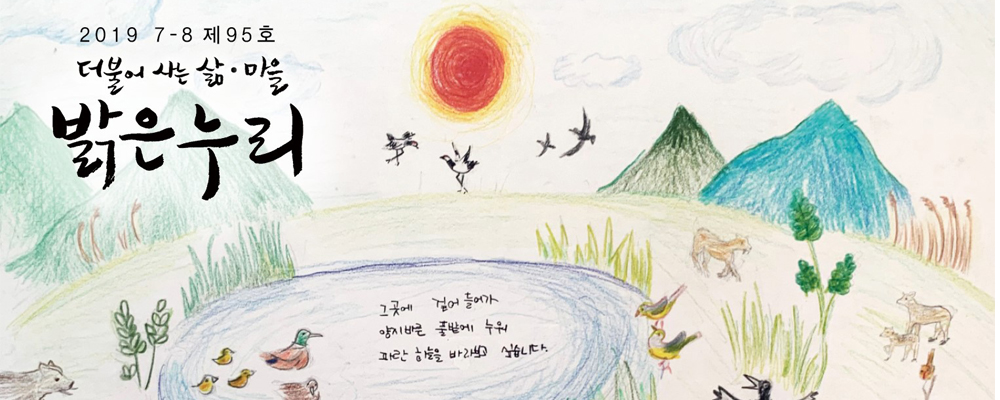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수련하고 연마하며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가을. 홍천터전에서 생태건축연구소 흙손 사람들과 함께 노동한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늘 메고 다니던 배낭과 옷가방 하나 달랑 들고 사랑채로 난 길을 걸어오를 때가 벌써 아득합니다.
그동안 흙부대집 두 채와 강당을 짓는 사이사이에 퇴비간, 뒷간, 닭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한 평 텃밭에서 20여 개의 단호박을 따서 나누고, 닭들과 어떻게 하면 겨울을 든든히 날까 고심하며 지냅니다.
한여름을 강당 지붕에서 뜨겁게 보내고 내려와 바닥에 보일러관을 깔면서 문득,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천장에 다닥다닥 붙어서 마감할 때와 지붕 끝에 매달려 나사를 박을 때 느꼈던 집짓기의 막연함은 사라졌습니다.

바닥 미장을 할 때였습니다. 흙손 사람들과, 서울에서 울력으로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세하여 흙을 비벼서 나르는 동안 두 분의 미장공 아저씨들의 신기의 손놀림을 보았습니다. 미장 칼이 쓱싹하고 두 번 지나가니 바닥이 평평해지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무림고수들의 검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은 곧바로 '얼마나 흙을 비비고 날랐을까'란 생각으로 이어져 흙을 열심히 퍼 날랐습니다. 비비고, 나르고, 쓱싹하는 환상의 호흡으로 60평 바닥 미장을 오후 2시경에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전날 한 평 반 보일러실을 우리 손으로 미장할 땐, 수평 맞추느라 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게다가 미장 칼 자욱이 선명하게 남더군요. 흉내내기를 넘어 뭔가 어설픈 구석이 남아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란 광고카피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손을 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깔끔함을 맛보려면 얼마나 많이 연마해야 할까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나'하고 갸우뚱하며 돌아설 때의 뒷맛은 언제나 찜찜합니다.
문을 손으로 만들려하니 이건 또 다른 세계입니다. 톱질, 대패질, 끌질을 다 동원해가며 작은 문 한 짝 만들어내려니 옛날 장인의 손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잘 하다가도 손끝 하나 까딱 잘못하니 똑 하고 부러지고 뻥하고 뚫립니다.

그러다가도 벽을 보면 마음이 한없이 흐뭇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마을사람들이 주말에 한걸음에 달려와 벽에 붙어 마지막 흙벽을 올릴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낌없는 수고의 흔적과 함께 저마다의 개성이 묻어납니다. '아, 이 부분 누가 했지' 하고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된 날도 많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부어주며 흙부대집을 지을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천장 마감하러 높은 데 올라서서 호흡을 맞추려니 날선 말들이 오고갈 때도 있고, 비가 많이 와 물기 많은 흙으로 벽을 쌓다가 한쪽이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할 수 없고, 매끈하고 깔끔하게 하려해도 마음만 같지 않습니다. 몸에 지긋이 남아 있는 통증은 기분 좋지만, 몸 한쪽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빨리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자기 수련의 과제가 노동하는 일상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강당 2차 공사까지 마무리 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 가을걷이를 한 논에 눈이 쌓이고 또 쌓일 때쯤이면 제법 우람한 건물이 우리 앞에 떡하니 서있을 겁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지은 강당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김동언
'생태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사람만 지치지 않도록 _ 아름다운마을43호(2013.12) (0) | 2015.01.02 |
|---|---|
| 이야기가 숨어 있는 생태뒷간 _ 아름다운마을42호(2013.11) (0) | 2015.01.02 |
| 생명이 숨쉬는 흙집 _ 아름다운마을40호(2013.08) (0) | 2014.12.31 |
| 쓰레기 없는 집짓기 가능할까요 _ 아름다운마을39호(2013.07) (0) | 2014.12.16 |
| 보온병 같은 집에 산다면? _ 아름다운마을37호(2013.05) (0) | 201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