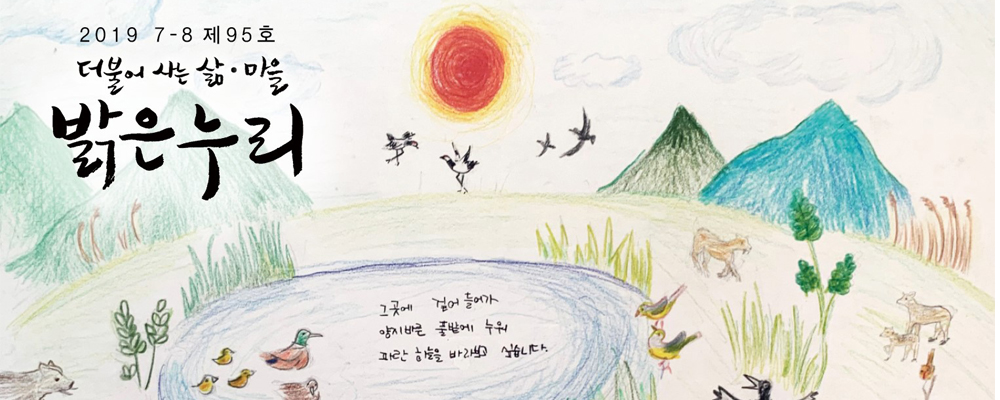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울력, 서로를 살리는 즐거운 수고
우리 몸으로 시도해보는 생생한 일들 가득
"누리야, 엄마 내일 홍천 다녀올게. 아빠랑 잘 지내다 하룻밤 자고 다시 만나." 금요일 저녁 짐을 꾸리며, 아이와 인사를 나눴다. 1박2일 짐인데도 꽤 많다. 쌀이며 가서 밥해 먹을 재료들이며 이불도 챙긴다. 강원도 산간 날씨에 대비해 잠바도 든든하게 입고, 작업복과 장갑도 있어야 한다.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시간이 될까 설렘과 긴장 속에 잠을 청했다.
토요일 아침 7시, 8인승 차에 7명이 앉아서 출발했다. 앉은 자리가 편치는 않아도 불평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오늘 오롯이 쉬기 위해 어제 야근을 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잠시나마 눈을 붙인다. 창밖엔 팔 벌려 맞이하는 산 아래로 추수 때에 다다른 황금들판이 출렁이고 있었다.
땔감나무 자르고 톱밥가루는 뒷간에
오전 10시 반, 강원도 홍천 아미산자락 효제곡마을에 도착했다. 여기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로 얼굴을 적시고 손에 받아 쭉 들이켜기. 이 물맛을 좋아하는 서울 친구들이 꽤 많다. 물 한줌으로 피로가 싹 가시고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목장갑을 끼고 마을 총무님에게 생활과 울력 안내를 받는다. 이웃의 밭을 밟지 않도록 마을 안에서는 천천히 운전하란다.
오늘 우리가 할 울력을 분배해 세 모둠으로 나눴다. 한 모둠은 자연농법으로 농사지으시는 분 밭으로 갔다. 다른 한 모둠은 땔감나무를 톱으로 토막 내는 일, 또 한 모둠은 마을학교 물탱크를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어떤 일을 할지 스스로 정하면 되는데, 나는 나무를 잘라 옮기는 일을 했다. 가을과 겨울에 구들장 땔감으로 쓸 나무다. 마을 총무님은 산더미같이 쌓인 나무를 가리키며 오늘 다 해놓고 가라더니, 한쪽에서 묵묵히 나무를 자른다.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이, 땀 뻘뻘 흘리며 낑낑 대는 우리와 사뭇 비교된다.
장작 패고 땔감 모으는 게 이리도 어려운 일인 줄 알게 된 한 홍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단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예전에는 선녀가 나무꾼과 살아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나무꾼이 선녀와 살아준 거라고. 나무꾼의 고된 노동을 경험해본 이들만 공감할 수 있겠다. 나무를 자를 때 잔뜩 떨어지는 톱밥과 가루도 버리지 않는다. 생태뒷간에서 똥을 누고 톱밥이나 왕겨를 덮어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 않고 발효가 잘된다고 한다.
정오에는 흩어져서 일하던 이들이 모여 침묵으로 기도회를 하고 밥상을 나눴다. 꿀맛이다. 특히 들깨가루와 효소로 맛을 낸 토란대나물 요리가 인기였다. 도시락을 빠뜨리고 온 사람도 십시일반 모아진 밥으로 배를 채웠다. 서울서 온 이들은 홍천 소식을, 홍천 사람들은 인수마을 소식을 주고받느라 대화도 풍성했다. 이번에 하진 않았지만, 이곳에는 다같이 드리는 밥상 기도문이 있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해, 물, 바람, 흙, 벌레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손길과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천천히 정성으로 먹고 서로 살리는 밥의 삶 살겠습니다.” 처음 홍천에 와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이 된 느낌이었다.
고추야, 너도 자라느라 애썼다
해의 온기를 받은 서당 툇마루에 팔베개하고 누웠다. 눈이 막 감기려는 찰나 오후 울력이 시작됐다. 나는 오후엔 밭에서 고추를 땄다. 빨갛게 잘 익은 고추들 사이로 간간이 병든 고추를 따 버렸다. ‘너네도 농부 못지않게 한 해 동안 자라느라 치열했구나, 애썼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새참으로, 가지를 따서 한 입 베어 무니, 생각보다 속살이 상큼하고 촉촉했다. 하천부지에 있는 다른 밭으로 갔다.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으로 개간하는 일이었다. 돌을 캐내고 풀을 베는데, 낫이며 쇠스랑 따위 농기구가 손에 익지 않았다. 돌은 끝도 없이 나오고 풀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 땅이었는데, 내가 파헤친 땅은 고작 손바닥만 했다. 해질녘 일을 마무리하자는 말에 막판 가속도라도 내려는데, 이젠 삭신이 쑤셨다. 보람찬 하루였다고 말하려던 포부가 자연 앞에, 농부 앞에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었다.
저녁밥상에선 각자 일하고 온 소감을 나누느라 왁자지껄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물탱크 속에 들어가 허리까지 차 있는 물을 빼내고 수세미로 박박 청소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모험담이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를 불러서 돈 주고 손쉽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도와서 몸으로 직접 시도해보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홍천에선 넘쳐났다. 물탱크에서 물이 안 나와서 이튿날 아침에야 문제를 해결하는 일 같은 시행착오들도 곁들여서.
사방이 깜깜한 밤 9시에 잠들고 이튿날 6시에 일어나 생태뒷간에서 시원스레 일을 보고 나왔다. 이제 서울 가서 뭘 해도 다 잘 풀릴 것만 같다. 컴퓨터 앞에서 머리만 쓰느라 몸이 굳어진다고 느낄 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질 때, 다시 이 땅에 찾아오리라.
최소란
'특집기사 > 농도상생의 삶(2012.10)'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원도 시골버스 안에서 꿈꾸는 세상 _ 아름다운마을31호(2012.10) (0) | 2014.10.03 |
|---|---|
| 흙과 벗하는 삶으로 일터를 가꾸는 _ 아름다운마을31호(2012.10) (0) | 201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