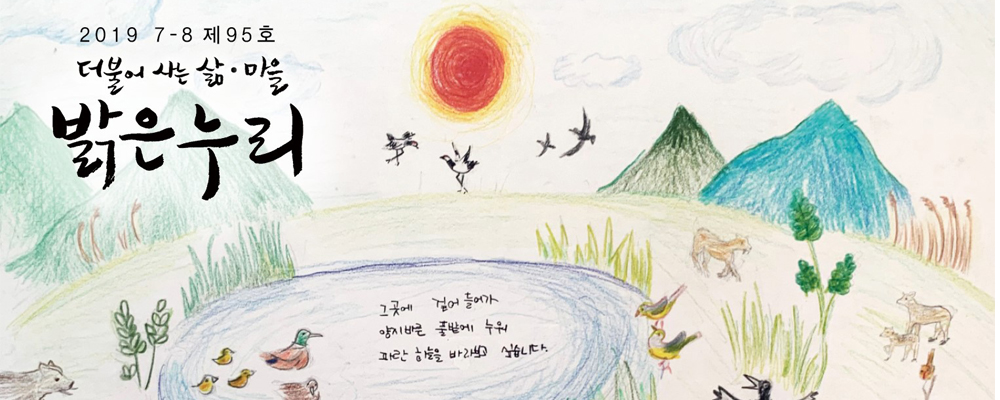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멋 부리던 된장남, 맛 부리는 된장남 되다
무엇보다 간편해서 좋았다. 전자레인지에 한 오분 돌려 전기밥솥에서 뜬 밥에 얹어주기만 하면 한 끼 준비 끝. 먹고 설거지까지 30분이면 뚝딱 해치울 수 있으니. 30분가량은 아껴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도시 자취생이었던 나에게 끼니는 때워야 하는 것일 뿐, 밥상을, 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몸에 좋다는 된장은 또 그렇게 싫어했다. 그 식감이, 맛이. 먹고나면 콤콤한 냄새가 배는 된장, 맘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요리는 고사하고 된장으로 소문난 식당에서도 김치찌개를 시키곤 했던 나. 몸에 좋다고들 하지만 된장은 내 입엔, 내 장엔 안 받는 음식이라고 생각던 나. 인스턴트식품을 즐기고 된장은 냄새조차 싫어하던 내가 어쩌다 된장요리 즐기는 '된장남'이 되었을까?
밥상보다 '끼니'였던 도시자취생에서

삶에서 감사가 넘치던 형들 넷과 '아궁이'라고 이름 지은 공동체방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레 '밥상'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 같다. 내가 형제방으로 이사해서 들어갔을 땐, 각자 퇴근시간이 달라서 저녁에 다같이 얼굴 보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매일 아침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한 일과로 설정한 시기였다. 돌아가면서 아침식사를 준비했는데, 한 형이 된장국을 끓이는 걸 즐기셨다. 그리고, 맛있었다. 신기하게 먹을 만했다. 감자 넣고 끓인 된장, 해물된장, 야채가 듬뿍 들어간 된장 등 종류도 다양했다.
'어라, 된장이 이렇게 깔끔한 맛이었나?' '텁텁한 게 아니라 구수한 것이었군!' 자주 맛있게 먹으며 된장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꿔갔다. 된장과 극적 화해를 넘어 로맨스로 이끈 건 요리였다. 된장과 새롭게 만나던 그날이 생생하다. 육수를 우린 물이 적당히 끓어 감자, 시금치, 파 송송 썰어넣고 된장을 넣었다. 뚜껑을 덮고 한소끔 끓인 뒤 맛을 보려고 한 숟갈 떠서 혀에 적셨다. '어, 이 맛이 아닌데?' 당황하여 소금, 국간장 등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다 넣었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다. '왜 녀석이 맛을 못 낼까?' 국냄비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된장 한 덩이가 시금치 밑에 다소곳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반갑던지! 된장을 잘 풀어준 뒤 푹 끓이니 구수한 된장 맛이 났다. 나도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 싶었다.
함께 사는 맛을 발견하다
괜찮은 장만 있으면 실패확률이 적은 음식이기에 된장과의 만남은 자연스레 잦아졌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그 깊은 맛을 단번에 구현해주다니, 구원투수와 같은 중요한 녀석이었다. 보기도 먹기도 싫어 안 넣었으면 했던 멸치와 다시마가 육수계의 특급 투톱이었다니. 다 차려진 밥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받기만 할 땐 몰랐던 것들이다. 과정을 몸으로 이해하며 음식이 혀에 닿을 때의 미각도 더 섬세해졌다. 이건 후추를 좀 쳤군, 진간장인가, 황태를 넣었나, 바지락 맛인데, 복잡하게 통합된 맛 속에서 세밀한 각자의 맛들을 선별해낼 수 있게 되었다. 다채롭게 펼쳐진 맛들과 하나씩 인사하며 음미하는 느낌이었다. 독특하던 각자의 맛이 엉키고 혼합되어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게 새삼 놀랍게 다가오기도 했다.
미각과 더불어 '함께 사는 맛'도 새롭게 깨달아간다. 아침 일찍부터 공동체방 식구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된장 풀던 형들의 구수한 뒷모습. 그 뒷모습을 통해 된장에 대한 애정과 살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리라. 혼자 살았다면, 삼분요리를 끼고 살았다면, 버튼 하나로 지폐 한 장으로 차린 밥상만 받아먹으며 지냈다면 느끼지 못했을 '맛'이다. 이제 자신 있는 요리가 뭐냐 라는 질문에 '된장국'이라고 대답하게 된다. 된장 한 덩이 냉장고에 있으면 든든하다. 된장에 대한 놀라운 인식의 변화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며 개인의 인식의 오류는, 함께 할 때 더 충일하게 극복됨을 느끼게 된다. 된장 한 스푼 정성 없이 풍덩 넣는 것이 아니라 밥상 함께 나눌 형들 생각하며 한콩한콩 정성껏 푸는 뒷모습, 이제 제가 보여드릴께요.
김승권 | 사회에 대한 여러 질문과 새로운 꿈을 품고 사는 직장인
'더불어사는삶 > 함께산다는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군가 가지런히 널어놓은 빨래 _ 아름다운마을45호(2014.03) (0) | 2015.01.05 |
|---|---|
|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누구와 함께? _ 아름다운마을44호(2014.1~2) (0) | 2015.01.02 |
| 어린이집 한지 도배, 내 손으로 하다 _ 아름다운마을42호(2013.11) (0) | 2015.01.02 |
| 2년 전 처음 느낀 그 맛, 매실효소 _ 아름다운마을39호(2013.07) (0) | 2014.12.16 |
| 한 방에 모여 잠자는 우리 _ 아름다운마을37호(2013.05) (0) | 201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