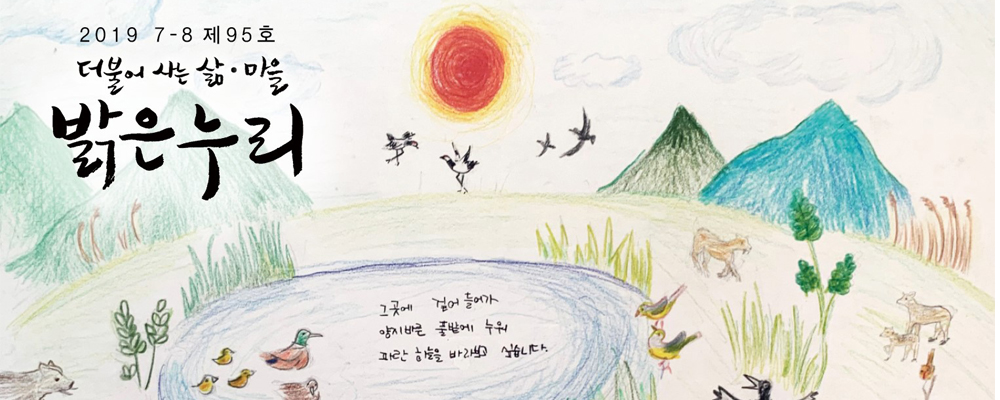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장 맛 아니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지?

여름, 새벽 김매기가 한창일 때다. 등이 뜨거워질 때까지 밭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깻잎 몇 잎 손에 쥐고 온다. 엊저녁 먹고 남은 찬밥에 막 따온 깻잎 찢어 넣고 된장 한 숟갈 넣어 쓱싹쓱싹 비벼 먹는 그 맛이란! 특별한 찬이 없이도 장만 있으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도 장을 만나 더 맛있는 반찬이 된다. 어디 그 뿐인가. 체했을 때 된장차를 마시거나 오랜 공복 후 식사를 할 때 된장을 곁들이면 속이 한결 편안해진다. 자연스레 우리 조상들에게는 집에 장이 없다는 것이 곡식이 떨어지는 것과 같게 여겨졌으리라.
오늘 우리 밥상의 장 의존도도 조상들 못지않다. 아침이면 흰 죽에 된장 풀어서 먹고, 점심에는 간장 조물조물 무친 시금치나물에 간장과 조청 넣어 조린 연근, 저녁에는 쑥 된장국으로……. 매 끼니 알게 모르게 빼놓지 않고 먹고 있는 장부터 자급하기 시작해야겠다 싶었다. 작년 한 해 콩농사도 짓고, 처음으로 메주도 쑤었다. 노린재의 콩밭 습격과 갈무리의 압박이 컸지만 그래도 순조로웠다 할 수 있다. 메주 띄우는 과정에 비하면 말이다.
지난 겨우내 온돌방 아랫목을 메주에게 내어주고 함께 지냈다. 잘 말리고 띄워야 나쁜 균이 번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잘 말리려다보니 너무 바짝 말랐나보다. 이불 속에서 2주를 보내고도 별다른 변화가 없기에 물도 뿌려주면서 습도를 맞춰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통 따뜻한 실내에서 말리면 절로 뜨기도 한다는데 실내 공기가 차가운 걸 고려했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이불로 뒤집어 씌워주었어야 했다. 늘 그 적당한 시점을 모르는 것이 초짜의 한계다. 게다가 메주 크기가 작아서 속까지 빨리 말랐을 거라는 생각까지 미치자 아차, 싶다.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옛 말처럼 평소 장맛에 기대어 밥상을 차리는 터라 잘 띄워지지 않은 깔끔한 메주를 보니 막막해졌다. 기댈 언덕이 무너진 느낌이랄까? 뒤늦게 해줄 일이라도 있을까 싶어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본다. 메주가 잘 떠야 장맛이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온다. 안 뜬 메주로 담근 장을 먹기도 하면서 해마다 부지런히 장 담그는 세월 속에서 비로소 장맛도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덜 뜬 메주로 담근 장은, 맛은 덜한 대신 메주콩에 담긴 생명과 갈무리, 메주 쑤고 장 담그는 전 과정에 담긴 수고와 정성을 더 잘 만나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맛으로만 밥상을 대하는 오랜 습도 조금씩 나아지겠지?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보기도 하고 올해는 메주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져본다.
춘분 즈음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아랫목에 누워 있던 메주 두 개를 반으로 갈라보았다. 겉으로는 깔끔해도 속이 제법 뜬 녀석도 있다. 간장독에서 나는 냄새가 진하게 난다. 나머지 메주도 냄새를 맡아보며 떴나, 안 떴나를 가늠해본다. 1/5 정도 떴나보다. 같은 조건에 있었는데도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메주들, 정말 살아있긴 한가보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과 장 담그고 가르는 걸 함께 하기로 했다. 생활기술시간이 있는 수요일에 날이 좋아야 하는데……. 월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한겨울처럼 굵은 눈발이 날려 다음 날로 미뤄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오후부터 날이 개서,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 소금도 녹여두고 화요일에는 볕이 좋아 메주도 씻어 햇볕을 쬐어줄 수 있었다. 흔히 얘기하는 길일은 아니지만 볕도 좋고, 학교 친구들의 생기도 함께 장에 담글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이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니 오늘이 바로 길일이다.
딱딱한 메주를 계속 입에 넣으며 달달하고 맛있다는 친구들. 왜 커다란 인절미 같다고 표현했는지 알겠단다. 아이들의 평가 속에서 메주가 뜨지 않고 마르기만 했다는 걸 다시 확인한다. 메주를 더 떼어 먹고 싶지만 된장과 간장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항아리 속에 메주를 넣는다. 미리 만들어둔 소금물 아래 가라앉은 고운 흙이 일지 않게 자기들끼리 서로 주의를 줘가며 조심스레 떠와서는 서로 서로 거름천을 잡아주며 살살 부어준다. 항아리가 깨졌나 확인하면서 혼자 물을 채울 때에는 꽤 오래 걸렸는데 친구들이 한두 바가지씩 부어주니 금방 찬다. 마지막으로 숯과 고추와 대추를 띄워주고, 40일 정도 지난 후에 만나기로 하고는 뚜껑을 덮어주었다. 친구들은 저마다 맛있게 되라며 한마디씩 응원의 인사를 건넨다. 이 글이 신문으로 나올 때쯤이면 장 가르기를 하고 있겠지. 메주가 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기대된다.
이한영
'하늘땅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힘차게 자라서 씨앗을 퍼뜨려주렴 _ 아름다운마을39호(2013.07) (0) | 2014.12.09 |
|---|---|
| 마른 씨앗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_ 아름다운마을38호(2013.06) (0) | 2014.11.26 |
| 내가 경험한 농생활은 _ 아름다운마을36호(2013.04) (0) | 2014.11.14 |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기 _ 아름다운마을35호(2013.03) (0) | 2014.11.14 |
| 쿰쿰한 냄새도 곧 익숙해지겠지 _ 아름다운마을34호(2013.1~2) (0) | 201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