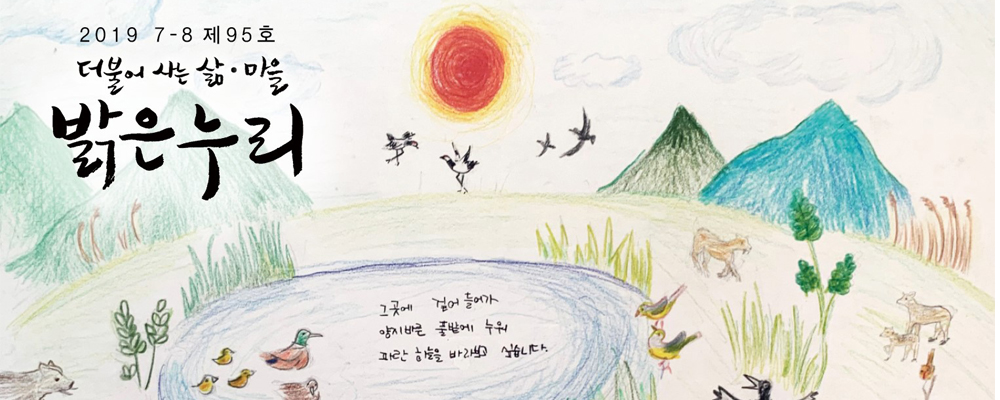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밭의 피할 수 없는 타자, 풀
김매기에 치이지 않으면서 풀을 농사에 이롭게 활용하기
“(상략) 젊은이 하는 일이 김매기 뿐이로다
날 새면 호미 들고 긴긴 해 쉴 틈 없이
땀 흘려 흙이 젖고 숨 막히고 맥 빠진 듯
때마침 점심밥이 반갑고 신기하구나
맑은 바람 배부르니 낮잠이 맛있구나
농부야 근심마라 수고하는 값이 있네 (하략)”
- <농가월령가> 중에서
여름농사는 김매기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뙤약볕 아래 농부를 밭에 붙들어놓고도, 좀처럼 안심을 주지 않는다. 비 한번 내리고 나면 풀은 한층 더 자라 있다. 씨 뿌려 심고 가꾸는 농작물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 농사의 반은 풀과 함께 간다.
명아주 캐다가 그날 찬거리로
봄에는 파종하고 모종 심는 일에 바쁘다보니 풀에는 손이 덜 가는데, 상대적으로 김매기가 수월한 편이다. 아직까진 풀도 키가 작고 더디 자라기 때문이다. 채소를 솎아주고 북주면서 풀매기를 같이 할 수 있다. 괭이나 호미로 흙을 긁어주고 덮어주다 보면 풀이 절로 뽑힌다.
소만이 지나면 풀의 기운이 아주 세진다. 비닐 없이 농사지으니 풀이 좋아라 밭에서 판을 친다. 감자밭엔 어김없이 명아주가 자란다. 색깔도 비슷하고 서로 나란히 커가고 있는 모습이 친구처럼 다정해 보인다. 명아주는 뿌리를 깊게 내려 땅 밑에서 물을 올려주기도 하고 줄기가 약해 쉬이 쓰러지는 감자 옆에서 든든히 서 있어주는 듯하다. 명아주 뽑고 웃거름 주고 폭풍소나기 내린 다음날엔 여지없이 감자밭에 힘이 없다. 그래도 명아주 대가 너무 세지기 전에 뽑아줘야 한다. 호미로 한두 고랑씩 천천히 캐다가 욕심을 내어 세 고랑을 캐니 손가락에 물집이 잡힌다. 감자밭에 널린 명아주를 뽑다가 손이 아프면 쉬어가며 그날 찬거리로도 만들어본다. 명아주를 데쳐서 무치면 소중한 나물 먹거리가 된다.
명아주는 크면 지팡이로 쓰일 정도로 웬만해선 잘 안 뽑힌다.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감자가 행여 상할까 조심스레 명아주를 뽑으면, 감자알 한두 개가 딸려 올라온다. 야생초들을 뽑다보면 길고 단단한 뿌리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잎과 줄기 못지않게 땅속에서 깊고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작물들은 무성하게 자라도 뿌리가 그리 깊지 않고 그로 인해 든든히 서있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감자보다 늦게 심은 옥수수와 고구마, 땅콩은 명아주의 기세에 눌려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씨앗이 발아하고 크는 과정에 풀이 먼저 커져서 작물이 못 자라거나 웃자라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고구마나 콩은 잎이 무성해질 때까지 초반에 철저하게 풀을 잘 매주어야 한다.
망종 이후부터는 풀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다. 7월에는 비도 맞고 뜨거운 햇빛도 받아 더욱 잘 자란다. 김매고 돌아서면 어느새 성큼 자라 있고 설령 뽑았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 뿌리를 내린다. 이때쯤엔 호미만으로는 제어가 안 되어 낫을 써야 한다. 바랭이와 같은 벼과 풀들은 땅에 기반을 두고 기어 다니며 몸집을 늘린다.
풀 모아 이랑 덮어주고 거름도 만들고
김매기를 한 풀들을 모으면 농사에 유익하게 쓸 수 있다. 베는 족족 작물 옆 이랑에 덮어주거나, 많으면 따로 쌓아놓고 퇴비로 활용하기도 한다. 풀멀칭을 하면 마른풀이 거름화되는 과정에서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고 밭에 유익한 미생물들도 생기리라. 그 풀을 다시 고랑에 두었다가 배추를 심고 거둔 다음 한 겨울에 이랑에 덮어주면 겨우내 흙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도시에서 온 친구들이 주말마다 울력으로 많은 양의 풀을 모아줬다. 풀을 쌓아놓고 오줌액비를 부어주면 습기와 영양이 공급되어 퇴비가 된다.
김매기는 힘들어도 풀은 농사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다. 풀이 채소들의 기운을 꺾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풀을 원망하게 되거나 김매기에 치어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흔히 풀을 없애려고 땅에 제초제를 뿌린다. 몸도 힘들거니와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는 시간과 노동과의 싸움 때문에 풀과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나 편하자고 먹는 것에 약치고 밭에 약치면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비닐을 치면 곡식의 건강성이 떨어지고 땅도 약해진다. 풀은 밭을 비옥하게 해주고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자연농법으로 풀과 공존하는 길은 무엇일까? 풀이 잘 매지고 쏙쏙 빠지도록 아주 부드럽고 유기물이 많은 땅으로 만들고, 작물을 무성하게 잘 키우면 풀도 덜 자라지 않을까? 옛사람들은 가축에게 꼴을 베어주면서 풀 베고 거름 만드는 일을 힘들어도 게으르지 않게 했단다. 어쩌면 풀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는 타자가 아닐까?
'하늘땅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하기 _ 아름다운마을35호(2013.03) (0) | 2014.11.14 |
|---|---|
| 쿰쿰한 냄새도 곧 익숙해지겠지 _ 아름다운마을34호(2013.1~2) (0) | 2014.11.05 |
| 올해 수확물, 다음 농사 씨앗이 된다 _ 아름다운마을33호(2012.12) (0) | 2014.10.09 |
| 볏짚 말리고, 야콘 캐고, 묵나물 만들고 _ 아름다운마을32호(2012.11) (0) | 2014.10.09 |
| 숲속 생명, 버섯 이야기 _ 아름다운마을31호(2012.10) (0) | 201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