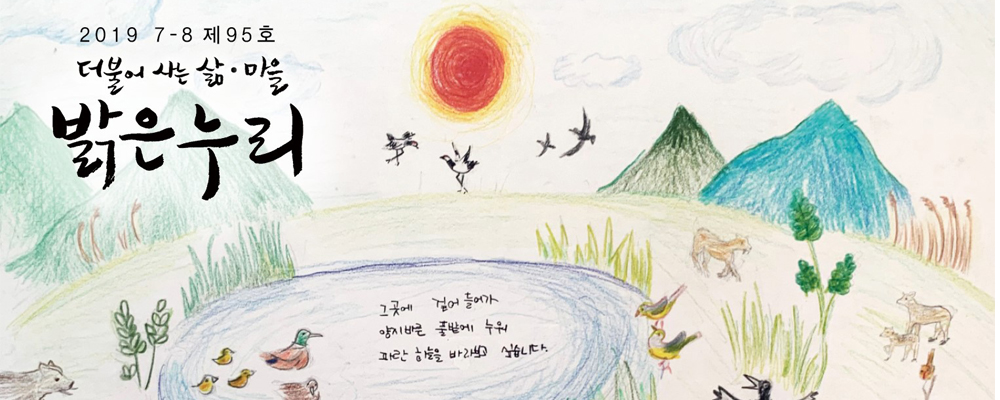티스토리 뷰
한 땀, 한 땀 내 옷 지어 입고 마음도 닦고
밤에 자기 전에 아이와 그림책을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는 설빔을 지어 입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의 청에, 어머니는 틈틈이 옷감 만들고 바느질해서 색동저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옷 입고 좋아서 연날리기하러 뛰어가는 장면으로 책이 끝나는데, 덮으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 나지는 않았습니다.
삼일학림에서 열린 '우리옷 만들기' 수업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손을 놀려 자기가 입을 사폭바지를 만드는 것인데, 몸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 길이를 재고, 옷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허리끈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라고 설명 들으니 더 긴장이 됩니다. 바느질 실력이라곤 홈질로 엉성하게 양말 겨우 꿰매는 수준이니 절박한 마음으로 미리 바느질을 익혀두는 연습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서양옷이 입체인데 반해, 우리옷은 평면이어서 평소에 접어 개켜놓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으면 입체가 되어 사람 몸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사폭바지는 허벅지 품이 낙낙한 것이 특징입니다. 허벅지 안쪽의 사폭이 옷감의 결 방향과 경사지게 붙어, 하체의 움직임에 따라 잘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씨름하는 옛 그림에 등장하는 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할 때, '한 땀, 한 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 바느질은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 잘 빠져나온 바늘이라고, 다음 땀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구멍을 확인하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손에 들이고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라며 꾸준히 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수련과 닮았습니다.
앞서 가지고 있던 얕은 지식이나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늘을 연필 쥐듯이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 모두 바늘에 수직이 되도록 잡아야 한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손톱도 찔리고, 여기저기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자주 바늘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점차 왜 그래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편하고, 힘도 덜 들어가고, 무엇보다 빠릅니다. 또, 바느질 자체보다는 실 꿰고, 매듭짓는 부수적인 작업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아예 실을 길게 해서 썼습니다. 나름대로는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이 꼬여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잘라내야 했습니다.
큰 그림을 뚜렷이 하고 만들다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고 원리도 터득하게 됩니다. 뒤쪽 박음질 선이 엉망이고 이러다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닌가 걱정되었는데, 선생님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쪽만 맞으면 그냥 쭉쭉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너무 작은 일에만 열중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설렁설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옷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흐름과 함께 바뀌어왔기에 편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몸의 기운을 막거나 너무 허하게 하지 않아 몸에도 좋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우리옷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입고 보니 훨씬 정이 갔습니다. 기능과 디자인을 강조하는 요즈음의 옷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입은 옷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은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옷감이나 모양새에까지 생각이 이르면 아득해 보입니다. 섣불리 자급이란 말을 꺼낼 수도 없지만, 해보고 나니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만 있는 것과 몸으로 부딪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잠 줄여가며 완성해서 입었을 땐 참 뿌듯했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사실, 처음 만들어본 옷인데 거친 손놀림 자국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계속 입고,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다음에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바지는 저에게 맞게 조금 바꾸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붙으면 저도 옛날 어머니처럼 아이 바지도 지어 입힐 수 있겠지요.
정재우 | 삼일학림에서 지난 가을학기부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들여 삶으로 잘 펼쳐내는 것임을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배움의숲'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너도나도 마음껏 힘 겨루기 _ 아름다운마을67호(2016.05) (0) | 2016.05.26 |
|---|---|
| 밝은누리움터 봄 운동회 풍경 _ 아름다운마을신문57호(2015.05) / 삼일학림(고등대학통합),생동중학교,강원도홍천 (0) | 2015.05.28 |
| 공부하며 노는 주말배움터 _ 아름다운마을53호(2014.12) (0) | 2015.01.14 |
| 서로 살리는 밥의 삶… _ 아름다운마을52호(2014.11) (0) | 2015.01.13 |
| 참된 '아'를 찾아 _ 아름다운마을50호(2014.09) (0) | 2015.01.09 |